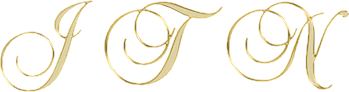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 신간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 발간
산림 기술·도구 등 제대로 발전 못해…”산림학자로서 기록 남기고파”

“조선의 산림이 황폐된 것은 당시 사회와 지배층, 지식인들이 산림이나 수목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과 무지가 초래한 재앙이죠.”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홍보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대 전영우 명예교수는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250년을 살펴보면 “조선의 숲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나무 박사’로 잘 알려진 그가 약 250년에 걸쳐 조선의 산과 숲이 사라지는 과정을 깊숙이 들여다본 책을 내놓았다.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 말 그대로 조선 산림의 아픈 역사다. 과거 한반도 전역이 울창한 숲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책은 지적한다. 1910년 이뤄진 조선총독부의 산림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체 산림 면적 가운데 32.3% 정도만이 무성한 숲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나무 없이 ‘헐벗은’ 면적도 25.9%에 이르렀다.
전 교수는 당시 조선에는 제대로 된 ‘기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무를 심는 방법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것”이라며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개발, 개량, 개선했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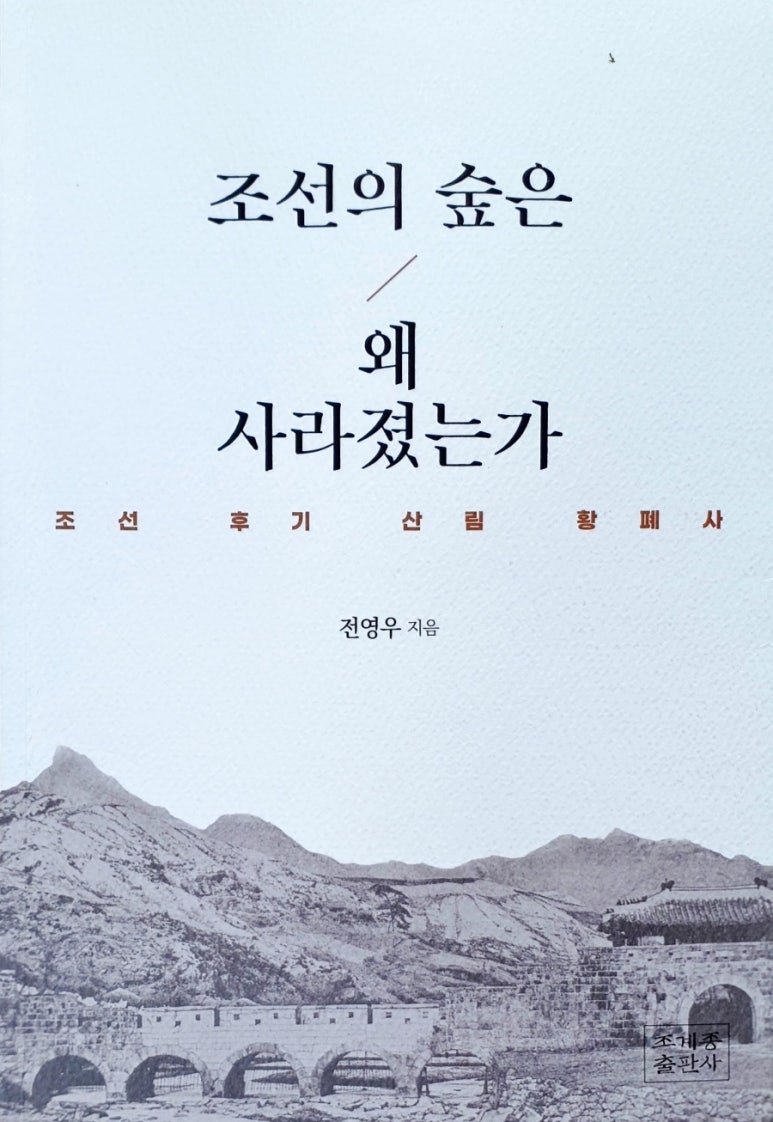
전 교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 모두 숲이 망가졌지만, 일본은 숲을 복구했고 조선은 그렇지 못했다. 조선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고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무를 자르는 작업 과정을 다룬 한국과 일본의 옛 그림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4명이 둘러싸여 (나무 목재를) 자르는데 일본 그림에서는 우리와 도구도 다르고 1명뿐”이라고 차이점을 짚었다.
전 교수 본인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칠순의 학자가 도전하기 좋은 과제’라고 말했지만,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 그는 정조 재임기 무인이었던 노상추(1746∼1829) 일기를 비롯해 각종 문헌과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고증했다. 특히 노상추가 17세부터 84세까지 약 67년간 쓴 일기에 대해 “당시의 산림 상황을 생생히 전하고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며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약 99년간 남산 능선의 바깥 산지를 조사한 ‘외남산식목적간’ 내용을 발굴한 점도 큰 성과다. 전 교수는 이번 책을 통해 ‘숙제’를 마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조선의 숲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다뤄야겠다는 생각은 1993년부터 했지만, 결국 30년이 지나서야 완성했다는 뜻에서다. 노상추가 남긴 일기를 고증할 때는 후손을 직접 찾아가 답사도 했다고 한다.

전 교수는 “사실 주변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어느 출판사가 책을 내줄 수 있을까’ 말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한 시대를 사는 산림학자로서 꼭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산림 정책에 대한 따끔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산림청이 지난해 탄소 중립적인 숲을 조성한다며 온 숲을 밀어 문제가 된 적 있다”며 “우리 사회는 산림 경영에 대한 경험이 아직 일천한데 더욱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I T 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